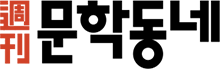입사 자기 소개서에 “나는 희로애락喜怒哀樂 중에 哀에 가장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라고 썼다. 자기 소개서라 그럴듯하게 말해본 것일 뿐, 실은 그냥…… 나는 울보라고 고백한 것이다.
지금보다 어릴 때는 나 자신을 동정하느라 자주 울었다. 내 손으로 망친 것들을 보며, 후회와 두려움과 그리움 때문에 울었다. 때로는 나라는 사람의 시시함을 견디지 못하고 울었다.
일을 시작하고서는 남 때문에 울 일이 많아졌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타인과 세상의 온갖 일에 연루되는 게 기자의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서, 어찌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 때문에 울었다.
그래도 한바탕 울고 난 뒤엔 일기에 꼭 왜 울었는지 적었다. 엉엉 울고, 눈물 닦고, 왜 울었는지 쓰는 것까지가 전부 과정이었다.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내게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졌고, 그러다보니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왔다. 그러니까 우는(쓰는) 건 어쨌든 이해해보려는 노력이었다. 나를, 타인을, 세계를.
궁상맞은데다 눈물 자국까지 말라붙어 있는 글이라 남들 앞에 내놓기 무척 부끄럽다. 그래도 훌쩍이는 사람한테는 모질게 안 할 테니까, 그런 측은지심에 기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울보의 글이지만 독자분들은 웃으며 읽어주시면 좋겠다.
(사실 이번주에도 청계천을 걷다가 울었다. 마스크의 장점은 길거리에서 울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아래의 사정을 들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덜 주책이다……)
2023년 4월
한소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