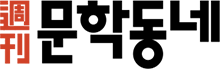12시가 가까워지면 묘하게 설레고 다급한 점심시간의 기운이 교실을 감싸기 시작한다. 손을 씻기 위해 교실 문을 여는 소리, 수업이 끝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맛있는 냄새가 문틈으로 솔솔 들어온다. 급식실과 가까운 교실의 아이들은 냄새만으로 오늘의 메뉴를 맞힐 수 있다. 학습지나 공책을 제출한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 게시판 앞에 모인다.
“야, 오늘 닭갈비 나온다!”
예외 없이 환호성이 따라온다. 곧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기대감을 안은 아이들이 손을 씻고 줄을 선다. 날마다 줄 서는 순서가 달라진다. 공평하지 않았다가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번호 순서대로 선다. 맨 앞에 섰던 사람은 다음날 맨 뒤로 가는 식이다.
줄을 세우는 건 힘들다. 맨 앞에서 선생님 손을 꼭 잡으며 가고 싶은 아이도 있고 어떻게든 뒤로 빠져서 친한 친구와 장난을 치고 싶은 아이도 있다. 손 씻는 속도도 일을 끝내는 속도도 저마다 달라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손 씻고 나오다가 친구와 마주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원수와 부딪쳐서 싸움을 하기도 한다.
“아 새치기하지 말라고!”
“쌤! 얘 장난쳐요!”
이동을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고발이 들어오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더 난리통이 벌어진다. 푸른 하늘 은하수를 하며 짝짝 손뼉을 치고, 발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유도 맥락도 없이 그냥 치고받고 엎치락뒤치락한다. 이런 대혼란의 틈바구니에서 끝없이 잔소리를 하는 어른이 바로 나다. 똑바로 서라. 딴짓하지 말고 앞사람 따라서 이동을 해라. 새치기하지 마라.
겨우 우리 차례가 왔다고 끝난 건 아니다. 작은 아이들이 급식판을 들고 두리번거리며 빈자리를 찾고 있으면 다른 아이들과 부딪치거나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얼른 앉을 데를 찾아 일러주거나 데리고 가서 앉혀줘야 한다. 이렇게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다 앉히고 내 차례가 되어 몇 술 뜰라치면 벌써 다 먹은 아이들이 급식판을 보여 주러 온다. 이른바 급식지도의 시간인 것이다.
디저트 뚜껑은 왜 이렇게 뜯어지지 않는 것인지. 일회용 간장과 연두부 사이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먹는 법도 집어드는 법도 반찬마다 다 다르니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도 담임의 일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채로운 아이들의 식판을 보다보면 밥맛이 뚝 떨어지고 숟가락 움직이는 속도는 저절로 빨라진다. 이것이 20여 년이 넘게 반복된 나의 점심시간이다.
유난히 기다림이 길었던 어느 점심시간. 세상 지루한 얼굴로 줄을 세우던 나는 한 아이가 밥 먹는 과정을 오래 지켜보게 되었다. 아직 단체급식이 서툴러 보이는 작은 어린이였다. 아이는 조그만 손으로 조심조심 식판에 밥과 국과 반찬을 받았다. 조금만 삐끗하면 흘리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식판을 들고 있다. 선생님이 알려준 자리로 아슬아슬 균형을 잡으며 걸어간다. 잘 잡지 않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버리는 급식실용 의자를 몸쪽으로 끌어 무사히 자리에 앉는다.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국을 먹고. 아이는 너무 빨리 먹거나 너무 느리게 먹지 않도록 속도를 맞추고 있다. 먹는 중간중간 다른 아이들을 보고 선생님도 건너다보고 다시 밥을 먹는다. 음식을 너무 많이 남기지 않으려고 신경도 쓰는 것 같다. 그렇게 오물오물 밥을 다 먹은 후에 일어서도 되는지 잠시 눈치를 본다. 식판 한 곳에 밥과 국과 반찬을 모으고 천천히 일어난다. 아직 밥을 먹고 있는 친구들 사이를 조심조심 헤치고 나와서 잔반을 버리고 식판과 수저를 정리한다. 집에서도 식당에서도 해본 적 없었을 그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그 아이는 천천히 그러나 빈틈없이 해내고 있었다.
여러 학년이 얽혀 밥을 먹는 소란한 틈바구니에서 훌륭하게 밥을 먹던 아이.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며 애를 쓰던 아이. 그날 나는 급식 먹는 어린이를 처음 제대로 본 것 같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매 순간 저런 노력이 어린이의 학교생활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자리에서 애쓰듯이 아이들은 아이들 자리에서 온몸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나 또한 그런 시간을 거쳐 이렇게 어른이 되어 서 있다는 것을.
학교를 그만둔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좋아하는 칼국숫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고요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었다. 내가 그렇게 원하던 학교 밖 평일의 점심시간. 이제 나는 그 점심시간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가끔은 급식실의 냄새와 소리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곳에서 밥을 먹던 아이들이 생각난다. 학교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촘촘한 노력과 눈물겨운 사회생활의 장면들이 조각조각 떠오른다.
이제 갓 여덟 살이 된 어린이가 열네 살 청소년이 되어 졸업하는 초등학교는 모두가 아는 곳 같지만 모두가 잘 모르는 곳이다. 다들 어린 시절을 거쳐와서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내 앞의 어린이는 내가 모르는, 나와는 다른 어린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고 그저 막연하게 뭉뚱그려 짐작하고 얘기한다.
나라는 존재를 넘어 세상의 법칙 속에 들어가 자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린 사람들, 내가 학교에서 목격한 것들은 그런 것이다. 내가 열심일 때 상대방의 열심은 잘 안 보인다. 그 상대가 어린이일 때는 더욱 그렇다. 나는 내 노력을 생각하느라 어린이들의 노력을 생각할 틈이 별로 없었다. 그런 장면들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학교를 떠날 때가 되어서였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본 것을 잘 써두고 싶다고, 잘 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쓰다보니 이것은 나에 대한 기록도 아니고 어린이에 대한 기록도 아니었다. 어린이들의 삶터고 나의 일터였던 교실, 그곳에서 함께 살던 너와 나에 대한 기록이었다. 너도 애쓰고 나도 애쓰던 그 무수한 점심시간들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