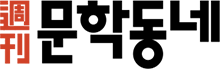이제 나는 늘 앉아 있던 교실 안의 내 자리,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글을 쓰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한다. 한적한 동네카페에서, 도서관의 커다란 책상에서, 어떨 때는 우리집 식탁에서. 일을 하다보면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점심시간이 다가온다. 가끔 외식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밥. 12시쯤부터 오늘은 뭘 만들어 먹을까 즐거운 궁리를 한다. 단출한 점심에는 차가운 맥주를 곁들일 때도 있다. 나 혼자만을 위한 고요한 밥. 이런 점심시간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말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것 같기도 하다.
어렸던 나에게 학교는 너무나 무서운 곳이었다. 유치원도 안 다녀본 내가 처음 속하게 된 커다란 사회. 선생님은 왜인지 모르지만 늘 화가 나 있었고 교실을 가득 채운 아이들은 낯설었다. 학교를 안 다닐 수 있다는 상상은 해본 적도 없어서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학교에 갔다.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는 교실. 그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교사라는 어른. 어린 나이에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교실 안의 서열.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어설픈 짝사랑도 했지만 학교가 내게 준 기억은 대부분 어두운 것이었다.
어른이 되어 교사로 다녔던 학교는 내가 어릴 때와 많이 달라져 있기는 했다. 하지만 진짜 달라진 게 맞을까? 그저 내가 힘 있는 어른으로 서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공포와 두려움을 잊은 건 아닐까. 학교는 여전히 무력한 존재들이 어쩔 수 없이 적응해나가야 하는 의무로 가득한 곳이다. 학교에 오기 싫지만 자기가 안 다니면 부모님이 감옥에 가야 한다며 힘없이 말하던 어린이를 나는 최근까지도 봤다. 그런 어린이들이 학교에 오는 게 조금이라도 즐거워지길,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길 바라며 애를 썼다. 하지만 교실에서 만난 어린이들은 예전의 나처럼 눈물을 닦고 있을 때가 많았다. 그 눈물을 닦아주기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돌아보면 인생의 진리를 전해주는 현명한 어른도, 추운 마음을 품어줄 따뜻한 선생님도 아닌 주말을 기다리며 퀭한 얼굴로 출근하는 직장인일 때가 많았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다. 항공운항과, 행정학과, 법학과, 미학과, 치의예과, 약학과, 영문학과를 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초등학교 교사를 내 미래로 그려본 적은 없었다. 딱히 아이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타고나길 무뚝뚝한 나였지만 ‘등록금이 저렴하다’ ‘여자 직업으로는 최고다’라는 어른들의 말에 떠밀려 교대를 선택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정 교사를 하고 싶다면 최소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라고 했다. 김선정이 초등학교 교사라니 당치도 않다고.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 반 아이들을. 지나가다 본 다른 반 아이들이나 다른 학년 아이들은 별로 예쁘지 않았는데 우리 반 아이들은 안 그랬다. 서로가 서로에게 낯선 3월, 말썽꾼들을 보며 내가 저애들을 좋아할 수 있을까 걱정하다가도 들장미 피는 5월이 되면 거짓말처럼 다 정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내가 실수하고도 억지를 부려도, 걸핏하면 말을 바꾸고 못나게 굴어도 개의치 않았다. 웬만한 실수는 대범하게 용서를 해줬으며 거리낌없이 다시 다가와주었다. 누구보다 나랑 노는 것을 즐거워해주었고 제 무리에 잘 끼워주었다. 작은 관심과 사랑에도 “우리 선생님 최고!” “우리 선생님 착하다!”라는 찬사를 보냈다. 아이들과 있을 때면 내가 좀 괜찮은 어른인가 싶었다. 어린이들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결코 받을 수 없는 칭찬과 격려를 받은 덕택에 나는 부풀려진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
‘사랑해요’라는 말이 대뜸 적힌 수많은 카드와 편지. 조금만 친해지면 그려줬던 내 얼굴. 색색의 종이로 접어준 하트와 꽃. 통 크게 나눠준 정체불명의 간식. 손등에 붙여준 스티커. 내 건조한 설명이 무색할 만큼 눈부시고 놀라웠던 수업시간 작품들. 이런 것들로 학교에서 내 일상은 다채롭고 화려했다. 솔직하고 겸손하며 나쁜 일을 잊는 데 선수인 작은 사람들 덕택에 나는 천성적인 우울과 비관을 잊고 많은 순간 낙관적일 수 있었다.
지난 23년간 내가 앉아 있고 서 있던 교실.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간 모든 어린이들. 이제는 얼굴도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내 인생에 단단히 자리잡은 수많은 사람들. 힘들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을 그 시간들을 통과해서 쉼 없이 살아가고 있을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이 글은 당신들 덕에 쓸 수 있었던 당신들의 선물이다.
모두 안녕한 하루를 보내고 있기를, 좋은 것들로 각자의 점심시간을 채우고 있기를.
2022년 가을
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