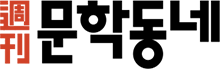영화를 보다가 뛰쳐나간 경험은 없다. 하여튼 본 걸 글로 써서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라 그렇다. 직업이 평론가라면 끝까지 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딱 한 번 정말로 뛰쳐나갈 뻔한 적이 있다. 라스 폰 트리에의 <어둠 속의 댄서>였다.
고통스러웠다. 정말이지 스크린을 북북 찢고 극장을 나가고 싶었다. 모든 아름다운 장면이 혐오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라스 폰 트리에를
매우 좋아한다. 견디기 힘든 감독이 가장 나쁜 감독인 건 아니다. 라스
폰 트리에의 영화는 하나의 거대한 농담이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과 관객에게 야유를 보낸다. 그래서 그의 영화를 볼 땐 ‘이번에는 또 무슨 야비한 농담을 했나'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극장에 가는 게 필요하다.
책을 읽다가 손에서 놓은 경험은 꽤 있다. 사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첫 챕터의 중간 정도만 읽고 ‘이건 다음에 다 읽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책장 앞쪽에 쌓아둔 책이 스무 권쯤 될 것이다. 책이란 어쩔 도리 없다. 책을 읽는다는 건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위다. 더 개인적인
행위다. 다만 라스 폰 트리에처럼 매번 볼 때마다 책을 던져버리고 싶게 만드는 데도 좋아하는 작가가
있느냐면, 있다. 미셸 우엘베크다. 사실 그의 소설도 하나의 거대한 농담이다. 그는 스스로를 파괴하며
독자에게 야유를 보낸다. 그래서 우엘베크의 소설을 볼 때도 ‘이번에는
또 무슨 야비한 농담을 했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넷플릭스에 올라온 리비 저베이스의 스탠드 업 코미디 쇼를 보다가 생각했다. 농담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다. 모두가 농담을 조심스러워한다. 모두가
어떤 농담이 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단 한 명의 누군가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듯 행동한다. 나는
가장 친한 친구와 가장 농밀한 농담을 주고받는 순간에도 “이건 정치적으로 불공정한 이야긴데 말이야"라고 미리 경고를 하는 버릇이 생겼다. 조금 정치적으로 불공정하지만
그걸 상쇄할 정도로 지나치게 웃기는 농담이라면 지구상의 누군가에게는 꼭 해야만 하는 성격이라, 큰일이다.
10회의 연재가 끝났다. 문학에
대해서 뭘 안다고 문학에 대한 글을 10개나 썼다. 실은
지구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불공정한 농담들을 써서 ‘문학동네'를
괴롭힐 작정이었다. 글을 쓰다 보니 문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주제에 문학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진라면 매운맛을 끓이려는데 막상 집에는 순한 맛 한 박스밖에 없었다. 그래도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하는 기분으로 글을 썼다. 더 야비한
농담이 되지 못한 건 내가 쫄보라 그렇다. 졸고를 견디고 버텨주신
<이봄 출판사>와 <문학동네> 편집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독자님도 읽어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