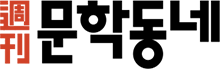어느 날 새벽, 문장이 사라졌다. 들개 세 마리가 나뭇가지 위의 새끼고양이를 올려다보고 있는 장면을 쓸 때였다. 나는 숲 그림자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꽤 오래 그러고 있었던 듯싶다. 불운한 개들의 과거가 좌르르 펼쳐지는 것 같았고, 미래마저 더 큰 불운으로 가득차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장면을 다 쓴 후에도 장면은 계속 이어졌다. 어느 시간인지 알 수 없는 시간, 특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그대로 옮겨졌달까, 전송되었달까 동시에 나도 계속 움직였다. 그러는 동안 키보드 위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일까? 원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건 몇 줄의 문장이 다였다. 새벽까지 쉴새없이 썼는데 고작 몇 줄이라니, 나는 크게 당황했다. 파일을 잘못 연 걸까, 펼쳐놓은 여러 개의 문서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문장은 없었다. 잘못해서 파일을 닫아버렸나? 나는 폴더를 뒤졌다. 없었다. 그러자 문장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모르는 새 파일이 저절로 접혔고, 그 안에 문장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는 출력해보면 접혀 있는 문장이 인쇄되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럴 리 없다고 여기면서도 출력 버튼을 눌렀다. 거기에도 사라진 문장은 없었다. 나는 노트북을 들어 앞뒤로도 살펴봤다. 바닥이든 커버든 노트북 어디든 파일이 숨어 있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사라진 문장을 찾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쓰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채워져 있더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어도 쓸수록 줄어들다니, 홀린 기분이었다. 홀린 기분은 홀린 기분인데 마이너스 귀신(귀신이 있고,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면)에게 홀린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기분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다. 아니, 오히려 좋았던 것 같다.
접힌 문장들이 있다. 문장을 쓰면 쓸수록 문장이 사라지고 단락이 줄어들어 마침내는 원고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원고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접힌 파일 안에 더 많은 것이 숨어 있다고 하면 지나친 변명일까.
연재가 시작된 후로 늘 쫓겼다. 소중한 시간이었는데도 쫓기느라 바빴다. 이제 나는 접힌 종이를 앞에 두고 차분히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숨어 있던 문장이 좌르르 펼쳐지며 종이 위에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믿는다. 풀숲에 텐트를 치고 있던 사람들, 꼭 그들은 아니어도 그와 같은 사람들, 어딘가 살짝 고장났다는 이유로 경계선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종이 위로 달려나올 것이다. 그들과 함께 나는 어느 한 시절을 보낼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 읽어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1년 가을
최정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