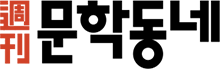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머리가 좋은 것도 공부를 잘하는 것도 남의 의견을 잘 따르는 것도 아니었다. 당연히 이렇다 할 경제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살짝 맛이 간 사람이라고 하면 설명이 될까? 그렇다고 대놓고 나사가 빠진 건 아니고 약간 풀린, 그러니까 아주 약간 고장난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는 놀고먹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늘 괴로웠다. 하는 일이 없는데도 늘 쫓기는 기분이 들었다. 그게 우스웠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툭하면 밖으로 나돌았다. 백두대간에 속한 한 국립공원의 주차장 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풀숲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몇 주를 지낸 적이 있었다. 낮에는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고, 밤에는 올빼미와 고라니 같은 날짐승, 산짐승의 소리를 들었다. 낮이든 밤이든 나는 텐트에 누워 밖을 내다보는 게 좋았다.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산등성이 위 그림자도 함께 이동했다. 해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빛깔을 바꾸는 산을 보고 있으면 하루가 그냥 갔다.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러다가 좀이 쑤시면 텐트 밖에 내어놓은 낚시용 의자에 앉아 숲을 바라봤다.
어느 날 풀숲에 연두색 텐트가 들어오더니 며칠 뒤 갈색 텐트가 하나 더 들어왔다. 넓지 않은 공간에 텐트 세 개가 옹기종기 모였는데, 그들도 혼자였고 나이도 나와 비슷한 것 같았다. 연두색 텐트 주변에서는 늘 콩콩 찧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비닐봉투에 담아온 곡물을 꺼내 그것을 매일 빻아 먹었다. 그러고는 텐트 밖으로 나와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체격은 컸지만 얼굴에서 수염을 걷어내면 스물을 갓 넘겼거나 곧 넘길 것 같았다. 갈색 텐트에 사는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늘 기타를 들고 계곡에 갔다가 저물녘에야 돌아왔다.
몇 주가 지나도록 우리는 한 번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게 법칙이라도 된다는 듯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서로가 거기에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체했다. 홀로 있는 듯, 같이 있는 듯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조금 무서웠지만 조금 덜 외롭기도 했다. 그들도 나처럼 살짝 맛이 간 사람들 같았는데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각자 지냈다. 그뿐이었다. 그게 다였다.
누가 먼저 그곳을 떠났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연히 그들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들은 그 시절의 나와 함께 지금도 국립공원 풀숲에 살고 있다. 풀숲에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 여전히 어딘가가 살짝 고장난 채 지금까지도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 나는 그들이 늘 궁금했다.
2021년 4월
최정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