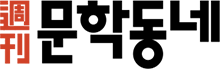연재를 마쳤지만 ‘연재를 마치며’를 쓰고 싶지가 않다.
연재를 마치지 않은 것만 같고,
왜인지 알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다.
‘연재를 마치며’가 계속해서 남아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으므로
가장 많이 느꼈던 마음을,
역시 부끄럽지만 맨 앞에 남겨두고 싶다.
다음에 아닌 척하지 않도록.
오늘은 12월 26일.
지금은 새벽 6시 43분이다.
그러니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연재를 돌아보는 건지 올해를 돌아보는 건지 모르겠고
7월쯤 연재를 마쳤다면 혹은 9월쯤 마쳤다면
지금과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과연 5일 후쯤부터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의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새해를 맞아 새 사람이 되어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되는 건가.
나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게 내 의지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을 때 오히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늘 그런 식이었으므로 그런 식의 신념을 갖게 되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거나 못할 거라는 망상을 버리고 그냥 사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해 쓰는, 유일한 전술인 것 같다.
여기까지 쓰고,
전부터 ‘연재를 마치며’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썼다가 지웠다.
나는 왜인지 그런 것들을 말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마다,
주란씨, 어떤어떤 부분이 너무 좋네요, 라는 메일을 받았던 것,
저 뒷산에서 매미 한 마리가 울었다는 메일을 받았던 것,
아직 매미가 울 때는 아닌 것 같아 진짠가요, 물었더니
진짜라고 했던 것,
너무 자책하지 말고 오늘은 쉬세요, 라는 메일을 받았던 것,
아뇨, 잘 끝났고 전 좋았는데요, 라는 메일을 받았던 것을
안간힘을 써서 떠올렸다.
그런 메일을 주고받은 덕에 사계절을 보낼 수 있었고(나는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하다가 중간부터는 아무 말도 쓰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런 편집자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난 단 한 자도 쓰지 못했을 거다.
‘연재를 마치며’를 쓰고 싶지 않았던 것치고
너무 길게 쓴 것 같다.
다른 건 몰라도 ‘연재를 마치며’에서 ‘연재를 마치며’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
자꾸 ‘연재를 마치며’를 쓰니까 비로소 연재를 마쳤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무언가를 직접 겪고서야 (그나마 조금) 아는,
그냥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알아도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더 마음을 다해 쓸 수 있다면 좋겠다.
무척 겁이 나지만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을 맨 앞에, 그리고 이 다짐을 맨 뒤에 남겨두고 싶다.
자꾸만 했던 말을 번복하거나
자꾸만 했던 말을 반복하더라도.
2021년 겨울
이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