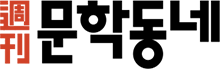이슬아의 말
남궁인 선생은 나랑 십 분 넘게 이야기를 나눠준 유일한 의사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병원에 다니며 살아왔지만 어떤 의사와도 십 분 이상 대화한 적 없다. 의사들은 늘 바쁘고 피곤하고 건조해 보인다.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니까 그럴 만도 하다고 짐작하지만, 사실 나는 병원을 잘 모른다. 그저 병원이 아주 복잡하고 바쁘다는 것만 안다. 남궁인 선생과의 십 분 넘는 수다는 병원 밖이어서 가능했다. 병원 안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얘기다. 그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다. 그것도 무려 코로나 시대의 응급실 의사다. 이 시절을 유독 특수하게 겪는 사람들 목록엔 그의 이름도 들어가 있을 것이다. 방역의 최전선인 일터에서 남궁인 선생은 일한다.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에서 친절을 잃지 않고 근무한다. 황혼에서 새벽까지.
내가 아는 남궁인은 주로 퇴근 후의 남궁인이다. 암막커튼을 치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쓰러졌다 일어난 뒤 그는 많은 글을 쓴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쓰지만, 어쨌거나 그의 책들은 대부분 유익하다. 응급실과 의학과 삶과 죽음에 대해 내가 몰랐던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준다. 의사라는 노동자를 이해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을 준다. 물론 그는 수많은 의사 중 한 사람의 의사일 뿐이다. 남궁인이라는 사람의 고유성이 그 책들의 진짜 주제다. 그의 고유성은 좀 피곤하고도 흥미롭다. 모두가 그렇듯 그 역시 유일무이하다. 나는 유일무이한 남궁인과 함께 얼마간 편지를 주고받을 예정이다.
사실 그는 의사 업무를 제외한 수많은 일에 서툴고 무심하다. 노래와 춤, 미용과 쇼핑, 사랑과 이별, 유머와 해학 등 몇 가지 결정적인 일들에 취약하다. 환자에게 몸을 잘 아끼라고 잔소리한 뒤 돌아서서 막상 본인은 대충 지내기도 한다. 의사로서는 어떻게든 멀쩡히 일하지만 자연인으로서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지닌 존재다. 작가로서는 아주 왕성하다. 그렇게나 바쁜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많이 쓰는지 나도 작가지만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마도 많이 읽어서일 거라고 예상해본다. 작가가 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책들을 그는 읽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친절함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 나는 그의 전문성도 문학성도 아닌 친절함 때문에 이 연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몹시 급박하고 절망적일 때조차도 그가 친절을 잃지 않았던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친절한 사람들이 아프지 않은 세계에 살고 싶다. 그런 세계에서는 친절한 사람과도 좋은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잘 싸운 뒤 만회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우정에 진입할지도 모른다. 그러고 싶어서 편지를 쓴다. 의사와 작가 사이의 이야기가 십 분이 훌쩍 넘게 이어질 것이다. 편지를 주고받는 동안 그의 방대하고 촘촘한 의학적 지성을 열심히 따라가보려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배움은 부디 병원 바깥에서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응급실에서 그를 만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
2020년 12월
이슬아
남궁인의 말
그와 저는 다릅니다. 연애할 때 흔히 “우린 서로 너무 달라”라고 하거나, 갤럭시와 아이폰이 얼마나 다른 스마트폰인지 비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제게 몇 백 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온 외계인과도 같습니다. 부연하자면 저는 치열한 학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스무 살에 의대에 입학해서 의대생과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수님 말씀 잘 듣고 과장님 말씀 잘 들으며 제 한 몸 보신해왔습니다. 물론 그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등등을 하며 살아오진 않았겠지만, 그는 제게 모든 규범을 거부하며 살아온 세계관의 슈퍼스타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에겐 결정적으로 제가 범접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는 구린 걸 구리다고 매우 능숙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라고 구린 게 구린지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늘 입 밖으로 내기에는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누군가 제 구림을 꾸짖을까봐 항상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저와 제 문장이 치열하게 구린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글에선 나이 많은 남성이 쓴 문장의 구림이나 행실의 어색함을 신랄하게 꾸짖는 대목이 자주 나옵니다. 저는 그때마다 실소하면서도 혹시 그 대상이 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가빠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앞에 선 저는 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와 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상에 단 몇 명만 읽어줄 글을 써왔다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겐 이 사실이 멋져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질하고 부족하니 긴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을요. 우리는 참으로 절절하게 반성하고 자책하면서도 타인의 이해를 갈구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글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다시 반성과 자책을 지나 풍파를 맞으며 내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무엇인가를 소진해버렸을까 두려워하는 과정을 겪지요. 이것이 그와 저의 결정적인 공통점입니다. 한눈에 우리는 그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뜻 서신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꾸짖음을 달게 받을 작정으로 서간문을 시작합니다. 글이란 내가 얼마나 구린지 본격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용기를 내 자모를 맞추고 문장을 만들어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저는 그의 앞에 서면 어떤 방어도 무용한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인하면서 공통점에 기뻐하거나 슈퍼스타란 무엇인지 궁리하며 답장을 써나가겠지요. 우리는 꾸짖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털어놓고 안아주면서 평생 해오던 쓰기를 연장할 것입니다. 문득 우리가 시작하려는 글쓰기의 요소가 인생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지가 끝나면 제 인생도 조금 ‘이슬아적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왠지, 두렵지 않은 기분입니다. 마지막 마침표가 찍히면 분명 저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요.
2020년 12월
남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