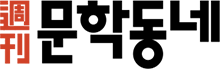슬릭의 말
지금의 슬릭이 부러워할 만큼 어렸을 때는 ‘되고 싶은 것’이 참 많기도 했습니다. 턱을 괴고 입꼬리를 올린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는 명랑한 어린이는 아니었지만, 꿈이 참 많았어요. 가수, 작가, 라디오 DJ, 작사가, 교사, 기타리스트, 작곡가…… 보통 창작과 관련된 직종이 많았네요. 그리고 어린 령화(김령화, 제 본명입니다)가 부러워할 만큼, 지금의 저는 원했던 정체성들을 얼추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정체성이 색색깔의 ‘마감’이 되어 캘린더를 빼곡히 칠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부러워할 일이 아니지만요.
이랑과 편지를 주고받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저는 드디어 몇몇 사람들에게(주로 편집자님에게) ‘작가님’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작가라니! 슬릭 작가님이라니! 얼마나 근사한 호칭인가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이랑과 주고받는 편지는 그 호칭보다 더 근사합니다. 이 복잡하고 서러운 서울 하늘 아래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물론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깊고 투명하고 촘촘한 이야기를 나눌 상대를 만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영화 같은 일입니다. 이 멋진 연결을 지켜봐주세요.
이제 어렸을 때 모았던 장래희망 중 기타리스트 정도만 아직 이루지 못했군요. 기타의 ㄱ자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전설의 기타리스트가 되어가는지, 그 감동적이고 스펙터클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주목해주세요. 만약 이 연재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기타의 ㄱ자도 모르는 저를 만난다면, 작가의 ㅈ자 정도는 알게 된 저라도 괜찮으실지요. 그때 마주볼 당신에게 우리의 편지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슬릭
이랑의 말
지난 8월 말부터 슬릭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이나 수필을 쓸 때와 달리 편지에선 자꾸 괄호를 쓰게 되더군요. ‘괄호가 너무 많은데…… 괜찮은가?’ 고민하던 중, 슬릭도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편지에 괄호를 자주 쓰게 되는지 아직 우리 둘 다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괄호가 많은 편지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평소 저는 글을 쓴 뒤 음성 읽기 기능을 통해 원고 내용을 귀로 재차 확인합니다. 눈으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비문이나 오탈자를, 음성으로 들으면 더 쉽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음성 읽기 사이트에서는 괄호 안의 내용을 읽어주지 않더군요. 무슨 이유로 괄호 안의 내용은 빼는 걸까요. (이 또한 이유를 찾는 중입니다.) 몇몇 음성 읽기 사이트를 테스트한 뒤, 지금은 괄호 안의 내용까지 읽어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괄호 안의 내용까지 전부 음성으로 들으니, 눈으로 볼 때와는 달리 문맥이 파괴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ㅋ……) (하하핫) (안 돼!!!) 같은 것들이 방해가 되더군요. 역시 괄호 안의 내용은 소리내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걸까요.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다시 듣는 글쓰기 과정은 꽤 피로합니다. (글쓰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피로를 동반하겠지요.) 그런데 정해진 한 사람에게 쓰는 글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즐거워 무척 놀라고 있습니다. 일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즐거움이 피로를 이기는 이 일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과로’하지 않고, 약간의 피로와 많은 즐거움으로 슬릭에게 편지를 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 이야기들은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2020년 12월
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