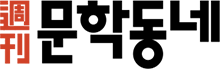말의 길이 끊어지는 곳을 향해 쓰고 싶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든 것이 언어라는 글을 쓰고 말았다. 여전히 자꾸만 세상에서 무언가를 읽고 싶으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싶다. 말을 하고 글을 써서 말과 글이 없어지는 곳까지 밀고 나가고 싶다는 포부가 있으나 애초에 우리 손에 쥔 도구가 모순된 것이므로 시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거친 스케치 정도를 해둔 느낌이다. 스케치북과 연필을 내밀어주신 강윤정 편집자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단단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말의 경계를 분명히 지음으로써 그것을 벽돌처럼 쌓아올릴 수 있다. 거대한 사고의 구조물을 만들고 오랫동안 튼튼하게 지속시킬 수 있다. 그것은 수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그 속에 가둔다. 우리가 쥔 말을 벽돌이 아닌 씨앗처럼, 뿌리와 줄기와 이파리처럼 여긴다면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