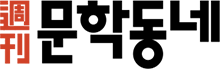우리는 대개 말을 도구나 연장처럼 생각한다. 의사를 실어 전달하는 그릇 같은 것으로. 그 비유는 쓸모가 있다. 그러나 가끔 원형 그대로 출토되어 우리에게 기쁨과 경이로움을 주는 옛 시대의 토기가 시사하듯, 그릇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릇 아닌 것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말은 차라리 풍경landscape 같은 것이 아닐까 한다. 말에는 언덕과 지평선이 있고, 숲이 있고, 그 숲속에는 말라 죽은 거대한 고목이 있고, 그 그늘 아래 새로 나는 풀포기들이 있다. 우리는 말 속에서 거닐며 말을 바라본다. 말은 그대로인 듯하면서 살아서 변화한다. 이끼처럼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이 있고, 세월을 두고 바라보면 조산운동이나 조륙운동에 해당하는 거대한 변화도 있다.
말의 풍경wordscape 속을 거니는 산책자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쓰려고 한다. 탐험가나 박물학자의 치열함을 갖지 못했을뿐더러 말로써 말 속을 거니는 즐거움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산책을 하다보면 때로 비바람 불고 힘겨운 날도 있겠으나 대체로는 자연히 눈에 들어오는 흥미로운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곱씹으며 걷는 게 다일 테니 이 글은 아마도 한가로울 것이다. 모든 글이란 것의 출발도 거기에 있다.
2020년 6월
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