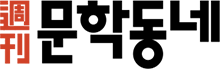지난 6월 19일에는 제주도 표선에 있는 한 모텔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는 근사한 바다가 있었고,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마흔여덟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모텔 베란다에서 모닝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문득 이 소설에 대해 새로운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망했다. 이 산이 아닌가베.”
잘못된 인생은 마치 작살과 같습니다. 한번 박히면 점점 꼬이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요.
누군가가 “당신은 소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원형적인 질문을 해올 때마다 저는 소설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천오백 매 정도 쓰고 나니 ‘수레’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소설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건지도, 이 거리의 공기도, 온도도 알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한판의 삶이지만 이 소설에서 주인공 수레가 걸어갔던 삶은 도무지 맘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설이 좋은 이유는 같은 인생을 다르게, 다시 살아볼 수 있다는 거지요. 사실 제가 출판한 소설 중에서는 한 방에 끝낸 소설이 없습니다. 『캐비닛』도 두 번 썼고, 『설계자들』은 세 번 썼고, 『뜨거운 피』도 출판사에 최종 원고를 보내기 십이 일 전에 전체적으로 엎고 다시 썼지요. 쓸데없는 고백을 하자면 첫번째 버전 『설계자들』의 주인공인 래생의 직업은 암살자가 아니라 암살을 계획하는 설계자plotter였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피』의 원래 주인공은 삼류 건달 희수가 아니라 그의 양아들 아미였습니다.
소설을 다시 쓰는 건 마치 일곱 살의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학교를 다니는 일 같습니다. 지난 생애에는 가지 않았던 골목길을 걷고, 미워서 만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고,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고백도 합니다. 다른 직업을 얻고, 다른 선택을 하고,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을 만나 같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연재는 이쯤에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산이 아닌 것은 확실한 듯하니, 작살을 뽑고 새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주간 문학동네>라는 아름다운 지면에서 연재를 할 수 있어서, 덕분에 늘 답답했던 수레의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어서 고맙고 좋았습니다. 편집부의 섬세하고 자상한 배려도 고맙고 좋았습니다. 독자님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의 작품이 집필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라는 <주간 문학동네>의 취지에 맞게 『빅아이』가 잠시 헤맨 길까지 동행해본 것이라 너그러이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따름이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시 1장 <물개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겨울이 끝나기 전에 『빅아이』를 끝내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지요. 먼길 따라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여름
김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