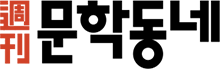대학 시절 참여한 동아리에는 일종의 ‘반폭력 규칙’이 있었다. 이때의 ‘폭력’은 불평등이나 차별 대우까지 포함하는 말이었다. 의사소통할 때는 소리를 듣기 어려운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 이동할 때는 휠체어를 타는 구성원이 참여 가능한 경로로 가자. MT에서 진행할 게임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를 고르려 애썼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공이나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한 존재임을 서로에게 확인시켰고, 또 훈련했다. 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였고 서울에서 먼 지방 출신이었지만, 그 때문에 내가 친구들과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아리 구성원과 함께 활동할 때마다 ‘장애 없는 신체의 효율성’에는 자주 감탄했다. 멀리서 불러도 빠르게 달려와 내 휠체어를 들어주고, 청각장애가 있는 구성원에게 내 말을 전달하러 다시 달려가는 이들. 밤새 술을 마셔도 다음날 수업을 나가는 저 인간종種과 내가 어떻게 평등하다는 말인가? 그들의 효율적이고 빠르며 균형 잡힌 몸은 아름다웠다.
몸에 대한 이런 감각은 장애가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심했던 것 같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였을까. 그런 탓도 있겠지만, 나는 몸에 대해 ‘차별적인 관심’을 갈망하는 인간이었는지도 모른다. 부자가 되어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하고 싶은 욕망은 없었기에, 현재의 가난한 내가 이대로도 온전히 평등함을 어렵지 않게 확신했던 것이 아닐까. 반면 몸에 대해서는 좀 으스대고 싶었던 모양이다. 빨리 달리고, 우아하게 움직이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번쩍 들어 올리고, 멀리까지 뛰고, 지치지 않고 술을 마시고. 탄력 있는 허벅지와 떡 벌어진 어깨를 특히나 바랐던 것도 같다.
어느 날 장애인 무용수의 공연을 보았다. 나의 협소한 관점에서는 무용이야말로 인간의 몸이 평등하지 않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무대였다. 처음 본 무용수의 움직임은 훌륭했으나 아름답지는 않았다. 나는 무용 따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서울의 유수 대학을 다니는 20대 대학생, 엘리트인 척 말하고 글쓰는 사람이라는 정보의 집합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려 애썼다.
삶은 예측 불가해서 어느 날 내가 어슬렁어슬렁 무대로 기어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그때, 평등한 존재가 되기 위해 여태 나의 몸을 숨겨왔던 일이 후회되었다. 그 이후 서로의 몸에 ‘차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서도 온전히 평등하게 서로를 대우할 수는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를 가졌거나 나이가 든 몸으로, 아름다움과는 결코 거리가 멀다고 취급된 몸으로도 무대에 오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서 꼭꼭 숨겨놨던 자신의 몸을 발견하고, 그 몸을 움직이며, 무대로 올라가 심지어 춤이라는 이름이 붙은 공연을 올리는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관심이 많다. 어떻게 그토록 숨겨왔던 몸을 외부로 끌어냈을까? 왜 그렇게 쓸모없다고 여겨진 팔다리를 사람들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무슨 이유에서 그런 움직임이 ‘춤’이라고 불리게 된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왜 그랬을까? 이곳에서 쓰려는 이야기다.
2020년 3월
김원영
P.S.
사회 전체가 위기에 직면한 시대에, 특히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약한 사람들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때에 이 글을 시작해도 될지 걱정했습니다. 어떤 몸들은 작은 병원에 갇혀 평생을 보내다 전염성 질환에 걸려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기본적인 평등조차 부재한 때에 그 몸의 ‘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부디 모두가 살아남고, 그래서 더는 갇혀 있기보다 밖으로 나와 몸을 움직이고, 춤을 추고, 오래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서 쓰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