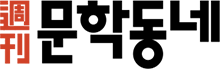이 소설은 과거를 딛고 새로운 시절을 살길 원했던 나와 가족의 이야기이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각자의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았다.
시절은 어떤 단위로 구분되는지, 그 끝과 시작이 여전히 의문스럽다. 시절 안에서 시절을 느낄 수 없다면 나는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를 향한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기억을 파헤쳤고 소설의 끝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썼다. 소설이 시간을 붙잡아주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지금 이 자리에 좀더 머물 수 있게 해주기를.
시절들이 켜켜이 쌓여 현재를 이루지만, 어떤 미래는 내가 끝끝내 원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럴 때면 생각한다. 어쩌면 욕심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고.
한 시절이 영원하기를 바란 적이 있다. 그것이 노력과 바람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비교적 최근에 깨달았다.
희망과 절망.
그 중간 어딘가에 이 소설은 도착할 것이다.
2025년 3월
민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