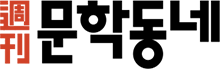삶과 이야기의 공통점 중 하나는 끝이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말이 있기에 안심하고 그 모든 희로애락을 통과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 장편소설을 쓰며 언제까지고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작가의 ‘개인 사정’으로 얼마간 연재가 중단되어도 완전히 끝나진 않은 채 다시금 꽉꽉 채운 줄글로 서사를 쌓아가는 기나긴 이야기를요.
어쩌면 저는 ‘연재’라는 형식과 조금은 친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주에 또 만나요!’
그렇게 손 흔들며 외치는 끝인사를 매 회마다 감춰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해와 달도 나날의 연재이고
매끼 먹는 밥도 구구한 연재이며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부디, 오늘도 무사히……'라고 소망하는 마음도 되돌아오는 연재의 형식을 지녔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찾아온 각설이가 실은 그 재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길을 거쳐왔는지 저는 이번 소설을 쓰며 설핏 엿본 것 같습니다.
지면을 내어준 문학동네와 함께해주신 김내리 편집자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더불어 모든 회차는 그 사이사이마다 저만치에 서서 기다려주시는 독자분들이 있었기에 무사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 ‘얼씨구 씨구, 절씨구 씨구’ 홀로 타령하며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일렁일 것을 기약하며
『리듬 난바다』의 물결이 잦아듭니다.
2024년 12월 김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