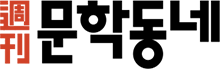한참을 돌아온 기분이다.
고백하자면 이 소설은 이미 한참 전에 쓰였어야 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전부터 쓰고 싶었던 얘기였으나 나는 차마 이 소설을 시작하지 못했다.
이 원고를 구상하는 지난 몇 달 동안 단 한 줄도 쓰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다. 소설의 첫 문장을 쓰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던 적이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오히려 무엇도 쓸 수 없었고, 썼다가는 일인칭의 외피를 입은 보기 흉하고 냄새나는 덩어리가 당장이라도 울컥 쏟아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 자신에게 되뇌었다.
더 가벼워지자.
한없이 단순해지자.
마치 1차원의 순간처럼.
아무 중량감도 없는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지난 두 권의 책을 써야만 했다는 사실을, 다른 무엇도 아닌 이 이야기를 쓰기 위해 지난 이십대와 삼십대의 삶을 덜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인간으로서 내가 쓰기 쉬운 자기 연민과 자기본위의 가면을 벗고, 작가로서 내가 부리기 쉬운 어떤 멋들어진 수사나 얕은 장치, 온갖 허위 들을 다 집어던지고 오로지 나와 내 진심만이 남는 순간을 나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리고 또 깨닫게 되었다. 이 소설은, 내게는 너무 각별해 차마 직면할 수조차 없었던 내 삶의 어떤 순간들을 담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이 소설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십대들의 사랑 이야기다. 자신이 누군지 깨닫지 못해, 기어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야 마는 어떤 모자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더불어 이 소설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기도 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 기꺼이 용감해질 수 있었던 어떤 시절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한없이 아름다울 수도 한없이 추악할 수도 있는 그 시절의 단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부디, 즐거운 동행이 되시기를 바라며.
2020년 3월
박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