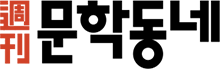넌 운동할 때
제일 예뻐!
지하 체육관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 어마어마한 크기의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두 줄의 글귀를 보자마자 제대로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이것이 현재의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요만큼의 페미니즘도 껴들 틈 없이 막아주는 부적 같은 마법의 말, ‘몸짱’과 ‘다이어트’마저 체육관 이름 옆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완벽했다.
운동할 때만은 그저 운동하는 사람이고 싶었을 뿐이다. 물론 그래봤자 보통 사람은 못 되고 여자가 되는데, 어쨌든 운동할 때만은 이반지하가 아닌 익명 대중의 육체이고 싶었다 이 말이다.
어쩌다보니 퀴어와 페미들이 유난히 적극적으로 육체 운동을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고, 그 덕에 웬만한 곳에서는 이반지하가 아닌 채 육신을 놀리기가 수월치 않은 현실이었다. 최대한 저렴하게 땀을 흘리게 해주면서 야물딱지게 운동 구미도 당겨주고, 동시에 그저 대중일 수 있는 곳을 찾아내야만 했다.
몇 달을 답답한 신체로 검색과 고민만 이래저래 반복하다가 에라, 본격적으로 주변 운동 시설들을 직접 탐방해보기로 했다. 이토록 정신만이 혼자 세상을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다. 반드시 육체를 적당히 혹사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함께 세상에 맞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삶을 지속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집 근처 꺅 게이 스피닝과 욱 부치 웨이트 학원을 차례로 체험하고 나자, 절대로 이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좀더 기존 사회의 전형과 틀을 답습한, 너무 열려 있거나 전복적이지 않은 에너지였다. 대안적이지 않은 시간이 목말랐다. 그러니까 조금만, 정말 조금만 정상적인 분위기의 꽉 막힌 운동 사회가 필요했던 것이다.
오랜 시행착오와 실험을 거쳐 마침내 나는 퀴어도 페미니즘도 거의 완벽히 방역됐음직한 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 다소 진상에 가까운 간보기와 사전답사, 집요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다다른 소중한 종착지였다. 관장의 호기심을 자극해 깊은 대화가 시작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무사히 3개월 선결제를 마치고 수업 시작 날만을 기다렸다.
고대하던 수업이 시작되자 천장 구석에 매달린 대형 스피커에서 귀에 익은 멜로디가 달달하게 흘러나왔다. 대중적인 리듬과 드라마틱한 전개, 그리고 적당한 신파까지 시대를 완벽히 풍미했던 바로 그 인기가요였다. 성범죄로 감옥에 간 멤버로 인해 웬만큼 올바른 체육관에서는 절대 플레이되지 못할, 그러나 여전히 부정할 수 없이 중독적이며 엉덩이가 절로 흔들리는 악마 같은 멜로디를 따라, 글러브를 낀 양손을 야무지게 두 뺨에 올린 채 원투 원투 스텝을 밟아낸다. 이 그룹의 음악을 다시 이렇게 큰 스피커로 향유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다. 이게 바로 익숙한 정상 사회의 맛, 통렬한 고향의 맛.
“여자 회원님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도된 곳으로 가, 정확한 좌표로 위치한다. 지금 나에게 여자 회원 같은 것이 못 되어줄 이유, 어디 있겠는가. 나는 마침내 대중인 것을, 수식어도 이름도 없는 일개 회원님인 것을.
복싱을 시작하자, 길지 않은 한세월을 살아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을 쥐어패고 싶었는지 깨달았다. 그냥 다 대놓고 쥐어팰 수만 있었다면 모든 것은 차라리 깨끗하고 선명했을는지 모른다. 그간의 삶에서 채워지지 못했던 욕망 하나가 위험한 고개를 들려 하고 있었다. 관장과 코치가 미트를 끼고 주먹을 받아줄 때마다 그 욕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더, 더, 더, 때리고 싶다, 또, 또, 또 때리고 싶다. 그저 세상의 대부분을 다 쥐어패버리고 싶다.
관장은 나에게 처음 오셨는데도 참 잘한다며 길에서 많이 싸워보고 오셨나봐요, 농을 쳤다. 마스크 밖으로 드러난 두 눈을 동시에 적당히 반달 모양으로 감아주며 아무렴, 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쥐어패지 못했을 뿐이다, 다만 아무도 쥐어패주지 못했을 뿐이다.
때리는 맛에 취하기 시작하면서 왕년의 복싱 챔피언이나 현역 복서들의 유튜브 채널을 하나둘 구독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오래 맛깔나게 팰 수 있을까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빠르고 세게 때리는 방법들을 눈으로 익히던 어느 날, 한 채널이 눈에 띄었다. 왕년의 복싱 챔피언이었다는 남자는, 복싱에서 완투 기본 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수의 실전을 거친 자 특유의 거친 말솜씨로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었다. 그가 나오는 영상들을 몇 시간 동안 털어 보고 체육관을 옮겨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을 무렵, 먼지라기엔 다소 큰 먹구름에 가까운 그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주먹을 날릴 때 팔만 뻗지 말고 허리와 엉덩이를 동시에 비틀어 온몸의 힘과 무게를 주먹에 실어줘야 상대에게 강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자신만의 무기를 정성 들여 세공해왔을 그는 그 소중한 주먹을 고작 자기 아내의 얼굴을 때리는 데 사용했다. 코뼈가 산산이 부서진 아내는 이후 평생을 비염과 코골이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한 TV 프로그램의 캡처 이미지와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다.
노트북을 잠시 덮었다.
그렇게 퀴어와 페미니즘을 거세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에 대해
잠시만 명상.
다시 노트북을 열어
구독을 취소.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디지털 복싱의 바다에 다시 한번 뛰어든다. 다시는 운동선수를 깊게 검색하지 말자 다짐한다.
모양만 보자, 모양만.
자꾸만 심연의 페미니즘이 여성 복서를 검색하게 한다.
핵심만 보자, 핵심만.
어쨌든 지금 그냥 막 잘 때리는 방법만을 배우고저 한다. 그 너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간주해내고저 한다.
그러다 결국 깊은 깨달음에 다다른다.
나,
복서 될 수 없다.
나,
조금도 맞고 싶지 않다.
나,
오로지 패고만 싶다.
그저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러고도 또 때리고만 싶다.
모두를 쥐어팰 수만 있다면,
한 대도 맞지 않고 그런 것이 허락되는 지금이 오늘 내게 와준다면.
그렇게 오늘도 나는 나만의 쨉쨉 유토피아를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