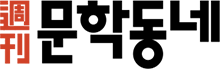세이 굿바이
호스텔로 향하는 길은 숲으로 우거져 있다. 땅 위로 불거진 나무뿌리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소지품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선에서는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고목들마다 줄고사리가 붙어 있다.
트럭 짐칸에서 문득 일본의 작은 섬에 혼자 도착한 날을 떠올린다.
그때도 누군가 선착장으로 나를 마중나왔다. 하늘도 바다도 블루레몬에이드를 쏟은 것처럼 쨍해서 선착장에 내린 나는 당황한다. 바다나 하늘을 바라보다 정신을 빼앗겨 길을 잃은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항구 끄트머리에서 여자 한 명이 손을 세차게 흔들며 다가왔다. 픽업을 나온 스태프였다. 그녀는 내 이름이 적힌 종이와 내 붉어진 얼굴을 번갈아 확인했다.
그녀와 함께 트럭에 탔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는 트럭은 몹시 덜컹거렸다
가파른 절벽들이 보였다. 아니 내가 그 위에 있는 것 같았다.
여자 스태프는 운전을 하며 이것저것 물었다.
내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럼에도 싱글벙글 웃으며 계속 쉴새없이 말을 걸어오던 그녀.
구불구불 가파른 산길.
절벽 아래 짙고 푸른 해안.
그때 나는 폭풍우가 쓸고 간 자리에 쓰러진 야자나무처럼 마음이 편하지도 성치도 않아서 그 미소에 화답할 여유가 없었다.
쨍하던 날씨가 무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태풍이 몰아쳤다. 나는 일본의 작은 바닷가 섬마을에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지내게 되었다. 다다미가 깔린 방, 영어를 하지 못하는 민박집 할머니가 나를 앉혀놓고 휴대폰 번역기를 거쳐 무언가를 말하곤 하던 아침.
‘내일도 모레도 태풍이 올 거야. 태풍의 눈이 보이니?’
할머니가 기상청 어플리케이션으로 기상예보를 보여준다.
“눈이 참 작네요……”
태풍의 눈은 움직인다. 약간 작아졌다 약간씩 커지기도 한다.
‘언제 배가 뜰 수 있을지 몰라. 대신 그때까지 숙박비를 싸게 해줄께’
번역기의 어색한 한국말을 이해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는 큰일을 해낸 것처럼 한숨을 푹 내쉰다. “아임 오케이.”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섬에는 수십 마리의 작고 마른 고양이들이 살고 있었고, 아침이면 태풍의 조짐에도 해변은 반짝거렸다. 저녁이면 쿰쿰한, 마른 풀 냄새가 나는 다다미 바닥에 엎드려 노트북으로 백인 여자가 주인공인 범죄 스릴러 드라마를 주로 봤던 것 같다. 섬마을은 저녁 여덟시 무렵이면 몇 안되는 상점마저 문을 닫았다.
캄캄한 골목을 배회하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금방이라도 내 얼굴로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별똥별을 본 날도 있었다. 가슴에서 무언가 찰랑거렸다. 노트북으로 본 드라마들 속 장면들보다 갑자기 뚝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별똥별이 더 비현실적이었다.
삶이 힘들면 내려놓으면 된다. 내가 택한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인정하면 되었다.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다녀야 했다.
번역기가 알려준 날씨. 나는 정말로 태풍이 지나가길 바랐던 걸까. 그 섬에 영원히 갇혀 해변을 거니는 말없는 외국인으로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루는 바다 수영을 끝내고 민박집으로 돌아와 혼자 젖은 모래를 털어내고 있었다. 입구에서 마주친 민박집 할머니가 갑자기 수돗가로 나를 데려갔다. 고무 호스에서 맑은 물이 콸콸 쏟아졌다. 그녀가 나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다. 당황한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움츠려든 발을 씻겨주던 손. 그녀의 활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궁금했다.
그 환대에도 나는 그녀와 작별인사를 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났다. 그때까지도 나는 작별인사를 배우지 못했다. 그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가고 나면 안 볼, 뜨내기 게스트라 짐작했다. 영원히 안 볼 사람에게도 뜨내기에게도 작별인사는 필요하다는 것을, 세이 굿바이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훗날 나는 여러 여행지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 배웠다.
세이 굿바이
감기에 걸려 상점인지 병원인지 모를 공간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다. 감기인지 일사병인지 알 수 없었다. 길을 걷다 현기증에 쓰러졌다. 보도블록 위를 기어서 간신히 병원처럼 보이는 곳의 문을 열었다. 의사가 증상을 체크하는 동안 긴급 귀국을 검색했다. 걱정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나였다. 왜 이따위 곳에 와서 이 꼴이 되었는가. 분노가 치밀었다. 충분히 저주하고 원망하고 나서야 화가 잦아들었다. 긴급 귀국은 대통령이나 하는 거지. 한국에 가고 싶었다. 놀고 마시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외국인들로 바글바글한 이 도시가 파괴되어 재로 흩어지길 바라는 심정으로 터벅터벅 호스텔로 돌아갔다.
호스텔 앞에는 항상 오토바이를 개조한 트럭을 몰고 와 과일을 파는 언니가 있었다. 그녀 이름은 ‘눗’. 호스텔을 오가는 내게 그녀는 항상 미소로 인사하곤 했는데 내 안색을 살피곤 걱정했다.
도시가 파괴되길 바랄 뿐인 나는 그녀와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간단히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끈질기게 나를 걱정했다. 무얼 먹는지, 에어컨을 너무 오래 킨 것은 아닌지.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싶었다.
내 삶과 관련 없는 사람을 걱정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냥…… 그냥이었다. 눈에 보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에는 조건이 붙지 않는다.
하이 시즌이면 그녀는 저녁도 먹지 못하고 과일을 팔아야 했다. 종종 편의점 도시락이랑 음료수를 그녀 자리에 두고 갔다. 끼니를 못 챙기는 그녀에 대한 걱정도 그냥, 그냥이었음으로. 그곳을 떠날 무렵 그녀가 물었다.
“너 언제 떠나지?”
“난 곧 떠나. 아마 내일이나 모레?”
“그렇다면 네가 떠날 때 꼭 말해야 한다. 우리 작별인사해야 해.
너는 나와 인사하고 떠나야지.”
이 글을 쓰며 뒤늦게 해석된 그 말이 뭉클하다. 서로 알게 되서 기뻤고 함께 있는 동안 서로를 아끼고 챙겨주다 각자가 다시 있던 세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떠나는 일에 좋고 나쁜 것은 없었다. 너무 늦게 배웠지만, 관계의 집착 속에서 이만 편안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라도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매일 창을 닦으며 나와 눈을 마주치며 장난을 치고, 함께 내 이불 시트를 갈고 바닥을 청소하던 하우스 키퍼 아줌마의 이름이 지금은 어렴풋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곧 떠난다는 말에 그녀는 눈물을 보였다. 나는 돌아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작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